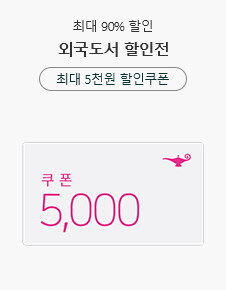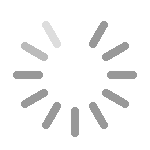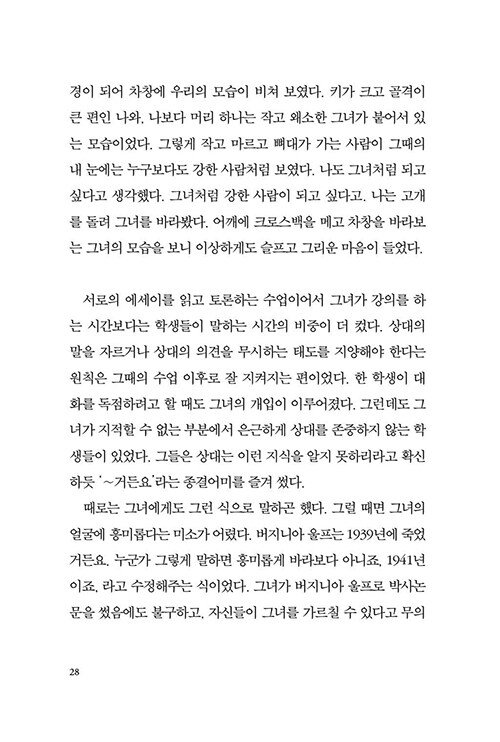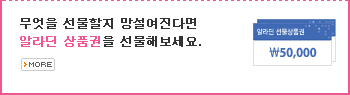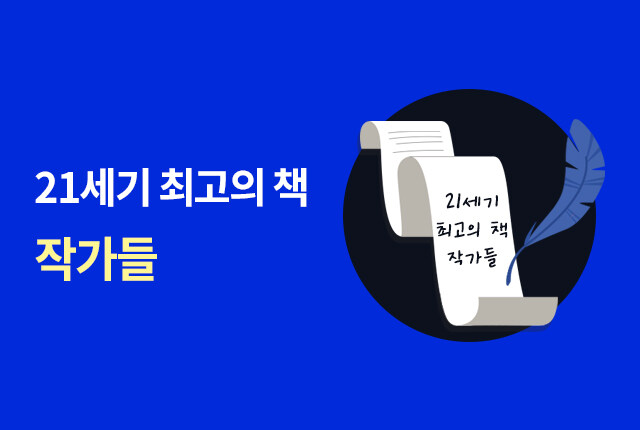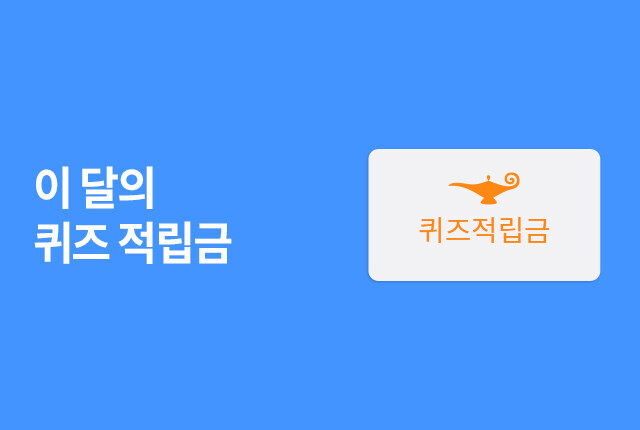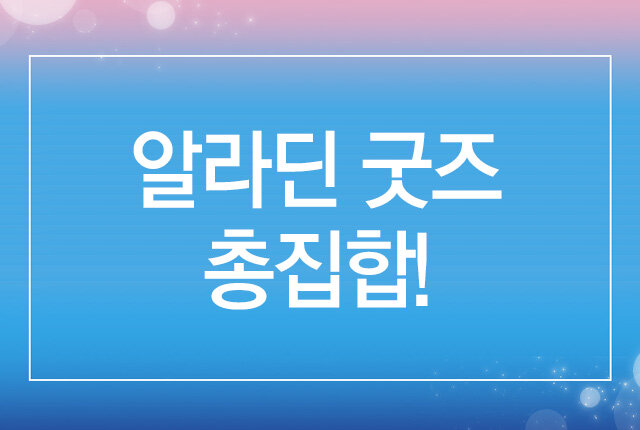|
이전
다음
종이책전자책 10,620원
- 배송료무료
- (중구 서소문로 89-31 기준) 지역변경
-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 15,120원 (10%, 1,680원 할인)
기본정보
기본정보
- 352쪽
- 133*200mm
- 494g
- ISBN : 9788954695053
주제 분류
- 국내도서 > 소설/시/희곡 > 한국소설 > 2000년대 이후 한국소설
- 국내도서 > 추천도서 > 알라딘 독자 선정 올해의 책 > 2023년 > 올해의 책 TOP 10
편집장의 선택
편집장의 선택
"그렇게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최은영은 데뷔작 <쇼코의 미소>(2016)에 "어떤 연애는 우정 같고, 어떤 우정은 연애 같다. 쇼코를 생각하면 그 애가 나를 더이상 좋아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었다."라고 썼다. 하필 뼈도 위도 아닌 마음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 꼭 나 같을 최은영의 애독자는 그의 문장으로 구멍난 자리를 기워가며 자랐으리라. '함께 성장해나가는 우리 세대의 소설가' 최은영이 데뷔 10년을 맞아 세번째 소설집을 엮었다.
때론 어떤 관계는 연애보다 로맨틱하다.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의 희원은 직장을 그만두고 늦은 나이에 간 대학에서 시간강사인 '그녀'를 알게 되었다. 영어 에세이 작문 수업을 들으며 '그녀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28쪽) 생각하기도 하고, 그녀의 작고 왜소한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슬프고 그리운 마음'을 느끼기도 한 희원. 이 관계는 꼭 연애처럼, 서로에 대한 기대가 상처가 되어 불현듯 끝난다. 매듭이 남은 자리에서 인물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 <몫>의, 교지 편집부에서 만났다 헤어지게 된 정윤에게 희영이 쓴 메일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싶었으면서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 편지들에 답하지 않았던 거 미안해."(82쪽)) <일 년>의 정규직 심사를 앞둔 비정규직 직원 다희에게 내가 하지 못한 말 ("내가 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해요."(118쪽)) 처럼.
권여선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읽을 때마다 생판 다른, 최은영은 그런 작가다.'라고 이야기했다. 우리와 함께 성장한 이 작가는 관대하지 못했던 나를, 잔인했던 나를, 제대로 소리치지 못했던 나를, 벌을 주듯 폭음하던 나를, 타인을 마음의 법정에 세운 나를 직시함과 동시에 용산 참사가 지나간 자리를, 민족 주권과 빈곤의 문제가 아닌 여성 문제를 말하는 사람을, 문간방 '식모'이던 노년의 한국여성이 홍콩의 외국인 가정부들이 머무는 창고방을 바라볼 때의 마음을 짐작해 본다. 깊은 애정에 마음을 긁힐 때의 통증을 알면서도 누추한 채로, 마음이 여린 채로, 너무 다정한 채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최은영의 소설에 의지하노라면 그 작고 연약한 사람들의 싸움을 더는 너무 슬퍼하지 않으며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다.
- 소설 MD 김효선 (2023.08.04)
시리즈
시리즈